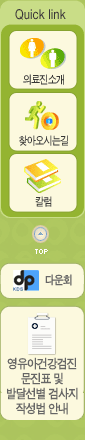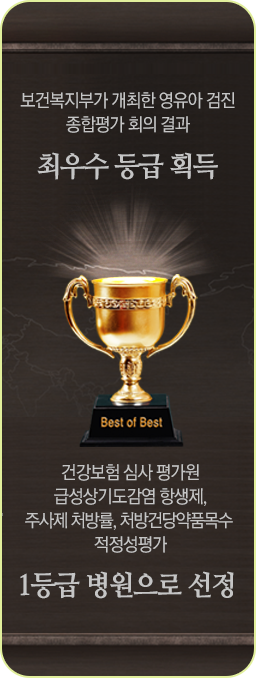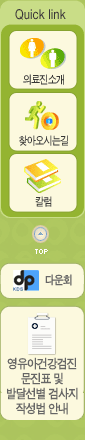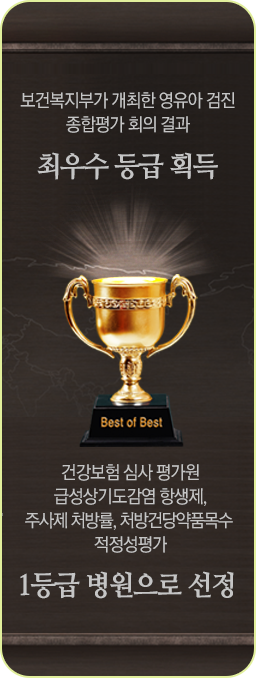|
|
 |
|
 |
개 요 |
|
|
심실 중격 결손은 선천성 심장병 중 가장 흔한 기형으로 전체 선천성 심장병의 25∼30%에 달하는 흔한 병이며, 좌심실과 우심실을 둘로 나누는 가운데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병의 자연 경과와 예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손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
 |
동의어 |
|
|
|
|
 |
|
 |
 |
|
 |
|
 |
정 의 |
|
좌심실과 우심실을 둘로 나누는 가운데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병은 일반적으로 심실 중격의 결손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막양부 결손(perimembraneous VSD) |
|
| 막양부란 심실 중격 중 가장 얇은 곳으로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인 삼첨판의 근처입니다. 심실 중격 결손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삼첨판의 근처에 결손이 위치하며, 중격류(pseudoaneurysm)라는 막을 형성하여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근성부 결손(MUSCULAR VSD) |
|
결손이 완전히 근성 중격 내에 있는 경우로(그림 : B, C, D) 결손이 여러 개이고 심첨부에 위치하는 다발성 근성부 결손(multiple muscular, VSD)은 영아기에 심부전과 폐동맥의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초음파로 볼 수 있는 작은 근성부 결손은 발생 빈도가 많으나 1년 이내에 자연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대혈관 판하 결손(subarterial VSD) |
|
| 결손의 위쪽 경계가 폐동맥과 대동맥 판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그림 E) 동양인에 비교적 흔한 편인데(서양 : 약 5%, 동양 : 25∼30%), 이 형에서는 자연 폐쇄가 드물고,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대동맥 판막이 아래로 빠져나오면서 판막이 잘 닫히지 않는 대동맥 폐쇄부전이 있어 의사들이 수술을 일찍 받으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
|
|
|
 |
|
 |
 |
|
 |
|
 |
증 상 |
|
|
심실 중격 결손은 결손의 크기에 따라 거의 다른 병이라 할 정도로 증상이나 자연 경과가 서로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증상은 결손을 통한 좌심실에서 우심실로의(좌→우) 혈액의 유출(shunt) 때문에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은 바로 다음의 '원인·병태생리'를 보십시오.
|
 |
작은 결손(small VSD) |
|
| 좌→우 혈액 유출이 적어 성장 및 발육이 정상이고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청진기로 들으면 시끄러운 심잡음(MURMUR)이 들리고 그 부위에 손을 대면 떨리는 진동이 만져집니다. 결손은 대부분 자연히 막히므로 대혈관 판하 결손(subarterial VSD)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필요없습니다. |
 |
중등도의 결손(moderate-sized VSD) |
|
| 평상시 별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어린이도 있고, 운동할 때 숨이 차며 쉽게 피곤하고, 호흡기 감염에 잘 걸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생후 1∼2년이 지나면서 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진기로 들으면 큰 잡음이 들리며 X선 사진에서 보면 심장이 약간 커져 있고 심전도 소견은 정상 또는 좌심실 비대가 나타납니다. |
 |
큰 결손(large VSD) |
|
영아기에는 심부전증, 심한 호흡기 감염이 잦으며, 신체 발육이 좋지 않고 진땀을 많이 흘립니다. 울 때나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에 청색증이 약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 가슴이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 수가 많고, 심장은 커져 있습니다.
중등도 크기의 심실 중격 결손 때와 마찬가지로 청진해 보면 수축기 잡음이 들리는데 오히려 잡음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X선 사진에 심장이 커져 있고 심전도도 이상이 있는데 흔히 양심실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빨리 수술하도록 권하는데 예외로 폐고혈압이 심하여 혈액 유출(shunt)의 방향이 주로 우→좌인 경우(Eisenmenger 증후군)에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원인/병태생리 |
|
원인은 다른 선천성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알 수 없으나, 일부 유전질환과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증상에서 설명한 혈액의 유출(shunt)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심실 중격에 의해 두 개의 심실로 완전히 나뉘는데 우심실은 수축기 압력이 원래 30mmHg 이하로 낮은 편이고 좌심실은 압력이 자신의 혈압과 같은 120mmHg에 달합니다.
혈액은 결손을 통해 압력이 높은 좌심실에서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유출되는데, 출산 직후에는 어떤 이유로 압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출이 적다가 점차 압력차가 커지는 생후 2~3주경에 유출이 증가합니다.
이때 청진기로 심잡음이 들리는 이유는 물이 흐르는 수도관에 구멍이 난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작은 물줄기가 뻗치면서 '쉬' 하는 소리가 쉽게 들지만, 수도관이 절단되거나 큰 구멍이 생기면 오히려 물은 콸콸 흐르고(shunt는 증가) 물이 뻗치는 '쉬' 하는 소리는 안들립니다.
혈액이 유출되는 소리(심장의 잡음 : murmur)는 결손이 작거나 중등도일 경우 더 크고, 아주 큰 결손인 경우에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러나 혈액의 유출이 많아지면 과도하게 많은 혈액이 폐동맥을 통해 폐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결과 폐의 울혈이 생기면 숨이 차거나 우유를 빨기 힘들어하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발육부전). 한편 폐동맥은 과도한 혈액의 흐름을 막아 폐를 보호하려고 수축하며 두꺼워지는데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폐혈관 손상이 일어납니다(Eisenmenger 증후군).
이런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큰 결손의 경우 영구적인 손상이 오기 전에 치료를 서두릅니다.
|
|
|
|
 |
|
 |
 |
|
 |
|
 |
진 단 |
|
의사들은 이러한 심잡음이나 혈액의 유출로 인한 숨찬 증세를 보고 심장병을 의심합니다.
소아의 심장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면 심실 중격의 위치와 크기를 직접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며, 동반되어 있는 심기형을 찾아내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손을 통한 좌심실-우심실 사이의 압력차, 혈액의 유출 방향, 폐혈류량 및 체혈류량을 측정합니다.
또 심도자 검사법을 이용하여 진단하기도 하는데, 심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법이 발달하고 생후 1세 전후에 조기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근래에는 소아 심장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심도자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검사로 결손의 크기, 혈액 유출량 등이 확실하지 않거나 임상증세와 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혹은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연장아 등은 심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
|
|
|
 |
|
 |
 |
|
 |
|
 |
경과/예후 |
|
전체적인 예후는 좋은 편이어서 많은 환자가 증상 없이 지냅니다. 작은 심실 중격 결손은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많으며(60∼80%), 자연 폐쇄는 대부분 만 1세 이전에 일어나고 6세까지는 대부분 닫힙니다.
중등도 및 큰 결손도 그 결손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으며, 드물게 완전 자연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소수의 환자에서는 나중에 우심실에서 혈액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 혈액 유출(shunt)이 줄어들고, 이 좁힘이 심해지면 혈액 유출 방향이 우심실→좌심실이 되기도 합니다. |
|
 |
예전에는 증상이 심한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여 영아기에 심부전증이나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
|
 |
큰 심실 중격 결손 환자 중 일부는 적절한 시기에 결손을 막아 주지 않으면 폐고혈압증과 폐혈관 저항이 높아져서 영구적인 폐혈관 손상을 동반하는 Eisenmenger 증후군(합병증 참조)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
합병증 |
|
 |
대동맥판이 아래로 빠져 대동맥 폐쇄부전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에서 많은 대혈관 판하결손(subarterial VSD)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환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합병증도 진행하여 10세 이후에는 비교적 많이 관찰됩니다. |
|
 |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의 벽이나 판막에 세균이 붙어 자라는 감염 혹은 염증을 말하는데 정상적인 심장에는 감염되지 않고 혈액 유출이 심한 결손부위에 잘 걸립니다.
전체 심실 중격 결손 환자의 2% 미만에서 발생하고 심내막염은 결손의 크기와 관계가 없으며, 사춘기에 더욱 흔하고 2세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내막염 예방법을 참조하시고 항생제를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
 |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
큰 심실 중격 결손, 동맥관 개존, 심내막상 결손 등 심한 좌→우 혈액 유출이 있는 심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막지 않으면 폐고혈압에 의해 폐동맥에 변화가 일어나 점점 막히는데 병리 소견에 따라 1~4도까지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3도까지는 수술로 교정을 하면 병변이 차차 회복되지만, 4도 이상 진행된 병변은 수술할 수 없는 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병변이 진행하여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면서 좌→우 혈액 유출이 감소하여 심부전 증상이 없어지고 심장 비대, 좌심방 및 좌심실 비대, 심잡음 등도 소실되어 외견상 증세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변이 더욱 진행되면 20대부터 우→좌 혈액 유출이 발생하여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 보이고, 심한 심장 판막의 폐쇄부전 및 심실기능 저하에 따른 심부전, 심잡음, 운동시 호흡 곤란 등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20대 혹은 30대에 가슴의 통증과 피를 토하는 증세, 뇌의 농양, 감염성 심내막염,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최근 칼슘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등의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심폐나 양측 폐 이식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
|
|
|
 |
|
 |
 |
|
 |
|
 |
치 료 |
|
작은 결손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예방조치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결손은 영아시기부터 적극적인 심부전증의 약물치료를 하고 폐혈관 질환(Eisenmenger 증후군)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내과적 치료를 하여도 증세가 심한 영아는 나이에 관계없이 수술을 합니다.
폐동맥이 좁아지고 있거나 대동맥 판막이 빠져나와 대동맥 폐쇄부전이 있는 환아는(특히 대혈관 판하 결손 : subarterial VSD) 즉시 수술로 합병증의 진행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수술을 하면 심장의 혈액 순환이 정상이 되며 커졌던 심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잘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어납니다. 심장수술은 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심장을 열고 하는 개심수술이며 수술 후 대개 1~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 합병증은 대단히 드물지만, 수술로 사망할 수도 있고 결손부위에 거의 심장의 전기 전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수술 후 전기 전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로 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치과치료 등을 받을 때 하던 심내막염 예방치료는 별도 지시가 없으면 계속하여야 하며, 6개월 내지 1년마다 정기적인 외래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이 까다로운 일부 다발성 근성 중격 결손(apical multiple muscular VSD)의 경우 카테터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예방법 |
|
대개 심실 중격 결손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심실 중격 결손의 합병증은 적극적인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며 감염성 심내막염은 항생제 예방요법이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 참조) 일반적으로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예방접종을 해주고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잘못했을 때는 꾸중도 하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경우 수술 직전은 피하고, 수술 후 1개월이 지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수술 등으로 연기된 소아의 개별적인 예방접종시기는 소아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선천성 심장병이 없는 다른 아이들과 같지만 중등도 이상의 결손을 가진 아동은 호흡기 감염이 더 자주 올 수 있고, 열이 몹시 날 때는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이럴땐 의사에게 |
|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심부전증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고열이 지속될 때는 마찬가지로 전문의에게 진료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산전진단 |
|
| 대부분의 심실 중격 결손은 일부의 아주 큰 결손을 제외하고는 산전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
|
|
|
 |
|
 |
|